Pro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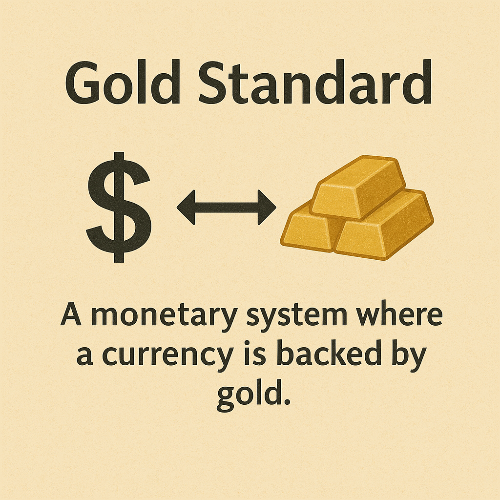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본위제 화폐를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며, 그 주인공은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 바로가기>이다.
본위(本位)는 본래의 위치라는 의미로 '중심이 되는 기준'을 의미한다.
금본위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주화는 그 자체가 금으로 만들어졌고, 지폐는 적힌 숫자만큼의 금이 실제로 보관되어 있다는 뜻이다.
금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문제가 발생학게 되었다. 이에 '최적화'와 관련된 경제학이 태동하게 되었다.
목차
1. 금과 은의 싸움
(1) 금과 은의 교환 비율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추적해 온 지표다. 이 비율은 수 천년 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정됐으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매우 큰 폭으로 요동친다.
약 6200년 전 이집트는 1년을 13개월로 나눴는데, 인류 최초의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이를 따라 1:13을 사용했고, 고대 로마는 1:12로 고정해서 사용하였으며, 미국은 1792년 화폐법을 통해 1:15로 고정했다.
| 연도 | 금과 은의 교환 비율 |
| 20세기 평균 | 1 : 47 |
| 2011 | 1 : 40 |
| 2020 | 1 : 104.98 |
(2) 은본위의 나라 중국
금은 은보다 귀했으나 화폐를 원활히 공급하기에는 절대량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화폐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의 관점에서는 은을 화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었다.
중국 명나라 초기에는 세금을 쌀이나 보리 등도 허용했지만 불공평과 비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1560~1570년대에 세제를 단일화하고 세금은 모두 은 한 가지로만 납부하게 했다. 이를 일조편법(一條鞭法) <바로가기>이라 하는데, 이때 명나라에 은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셈이다.
| 구분 | 금과 은의 교환 비율 |
| 명나라 | 1 : 6 |
| 유럽 | 1 : 12 |
이러한 금과 은의 교환 비율 때문에 많은 은이 중국으로 몰려가고 반대로 많은 금이 유럽으로 유출되었다.
유럽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을 식민지와 유럽에서 구한 뒤, 은이 귀한 중국에 가져가서 두 배의 막대한 차익을 남겼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왜 금(金)행이 아니라 은(銀)행이라는 말이 정착됐을까? 영어의 뱅크(bank)를 동양식으로 번역한 최초의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은본위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금행"이 아닌 '은행'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2. 금본위제의 정착
세계 최초의 금본위제는 1719년 영국 조폐공사의 사장을 맡고 있던 뉴턴이 영국에서 도입한다. 이후 1870년대에 이르렀을 때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금본위제가 보편적으로 채택된다.
법적으로는 1816년 영국 의회가 '금본위제' 법안을 통과시켜 금이 국가의 법정화폐임을 성문화했다.
미국은 금본위제의 도입과 폐지를 여러 번 거듭한 국가다.
1873년 최초로 복본위에서 금으로 통일했다가 이내 정지하였으며, 다시 1879년, 1900년, 1944년에 도입과 중단을 반복한다. 이 중에서 1944년에 금본위제를 채택하게 된 브레튼 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 <바로가기>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산업혁명과 금본위제의 확산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복본위제나 은본위제를 버리고 영국을 따라 금본위제를 채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영국의 산업혁명이다.
1765년, 영국의 제임스 와트(James Watt) <바로가기>가 증기기관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증기기관은 생산수단의 동력은 물론 증기선, 증기 기관차 등 수송 기능의 절대적인 변혁을 의미했다. 이로써 런던은 경제적 상업적 중심지로 부상했고, 그에 따른 인접 국가들 입장에서는 영국에서 이미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금본위제를 채택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더 유리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세계의 부는 런던의 금융가로 집중됐고, 영국은 세계의 은행이라는 이름을 얻은 강력한 경제력으로 세계 경제를 앞에서 이끌었다. 도시의 대규모 생산은 상품 범람을 불러왔고 인류사회는 결핍으로 고민하던 사회에서 상품이 넘쳐나는 사회로 모습을 바꿨다.
- 미야자키 마사카츠
3. 경제학의 태동
(1) 애덤 스미스(Adam Smith): 자유주의

경제가 학문으로서 등장한 시기는 대체로 애덤 스미스에서 찾고 있다. 그의 저서 "국가 부의 본질과 원천에 대한 연구" 혹은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1776)"은 경제라는 거을 학문의 장으로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도 증진된다는 개념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자율적 교환은 공공의 이익을 자연스럽게 이끈다는 주장 -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시장 경제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는 원칙
정부는 국방, 사법, 공공사업 등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여야 한다고 봄
현대 경제는 아마존과 같은 독점적 기업 하나에 의해 전 세계가 휘청거릴 수 있다. 약탈적 시장 점유를 위해 초저가로 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의 암묵적 선택을 강요한다.
시장의 왜곡이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지배하는 현대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2)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국가 주도의 재정정책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자유경제가 표방하는 '보이지 않는 손' 대신 정부가 개입하는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재정정책이란 재정 즉,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행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을 말한다. 재정정책이 가장 빛을 발한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뉴딜(New deal) 정책 <바로가기>이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쑥대밭이 되는 동안 군수 물자를 수출해 막대한 부를 얻은 미국은 1920년대 전대미문의 경제 호황을 누린다. 1929년 9월 3일 다우존스 지수는 381.17로 9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유동자금이 유발하는 경제의 거품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개장 시 305.85로 시작한 다우존스 지수는 장 시작과 동시에 11% 가까이 폭락하였고, 계속되는 폭락으로 1932년 7월 7일에는 주가지수가 40.56까지 하락해 최고점 대비 89%나 떨어졌다.
1929년 10월의 미국 증시 대폭락으로 시작된 이후 10여 년 간을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 시대라 부른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GDP는 25%나 감소했다.
경제 대공황은 케인스의 재정정책 이론에 힘을 실어준 계기가 되었다.
케인스는 금본위제를 반대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의 저서 "화폐개혁론(A Tract on Monetary Reform)"에서는 금본위제를 야만적 유산(Barbarous Relic)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3)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신자유주의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경제 시장체제를 옹호하는 학자로서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통화폐의 물량 조절에 있다는 소위 '통화주의'를 창시한 경제학자이다.
케인스가 주장한 강한 정부의 역할은 미국의 뉴딜 정책의 성공과 함께 20세기 경제의 정답처럼 신봉돼 왔지만,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영국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해 공격을 받는다.
프리드먼은 케인스의 재정정책, 즉 큰 정부를 부정했으며, 대신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이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활동 수준을 조절하려는 정책 행위를 뜻한다.
통화종책 주의자들은 통화 공급량만 적절히 조절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으며, 지속적인 통화공급을 위해 금본위제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 애덤 스미스 | 케인스 | 밀턴 프리드먼 | |
| 사상 | 자유방임주의 | 정부의 공공지출 | 신 자유방임주의 |
| 방법 | 보이지 않는 손 | 재정정책 | 통화정책 |
| 금본위제 | - | 반대 | 반대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좋은 공인중개사 알아보기 (7) | 2025.04.09 |
|---|---|
| 미국의 달러 (1) | 2025.04.06 |
| 은행의 탄생 (1) | 2025.04.05 |
| 화폐 경제: 화폐의 등장 (4) | 2025.04.04 |
| 트럼프 관세 전쟁 확대: 동맹도 예외 없다 (2) | 2025.04.03 |



